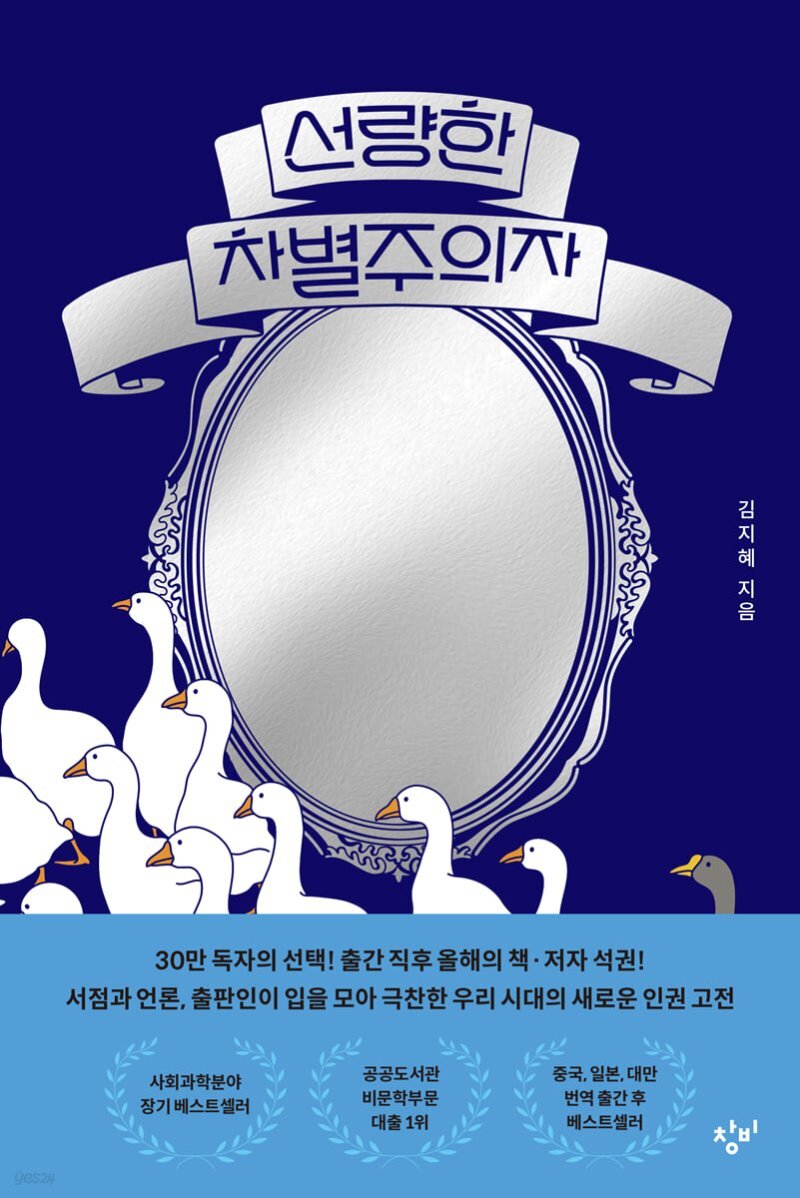독후감 - 2020년 11월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저 | 창비 | 2019년 07월 17일
제목을 보자마자 나의 이야기일 것 같은 책이었고, 회사 독서 모임을 시작하며 자유롭게 책을 선택할 기회가 왔을 때 단연 처음으로 꼽은 책이다.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권정민(Cojette, 꼬젯) 님이 추천한 도서 중 하나였고.
두께나 글자 수가 적은 것에 비해 생각할 거리도 많고 한장 한장 반성할 것투성이라 마음으로는 매우 무거운 책이었고 쉽사리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차별을 선택하는 사람, 차별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왜 생겨나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지 매우 따스하고, 침착하게 설명해준다. 장애인이든 여성 문제든 내가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선 반대론자들의 경제 논리, 공정함에 관한 주장에 똑 부러지게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 항상 아쉬웠는데, 이 책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
밑줄 치고 싶은 구절도 많았고 꼭 기억해야지 싶은 문장도 많았는데, 열흘 정도 지나니 다 잊어버렸다. 가끔 다시 꺼내 보고 계속 자극을 받아볼 만한 책이다.
특권의 발견
짧은 기억력에도 특권을 발견한다는 표현은 잊히지 않는다.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차별과 차별을 말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 150번 저상 버스가 휠체어 둘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을 보고 사진을 올렸고, 한 친구가 아직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사실 종종 봤다. 사람이 없는 시간에만 타신다. 회사는 자율출퇴근이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 가끔 봤던 것 같다. 그렇지, 아무래도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은 어렵겠지란 생각은 그때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새롭게 떠오르는 건, 언젠가 버스정류장에서 휠체어에 오른 세 분이 모인 장면이다. 그런 욕구가/상황이 있으리라 상상해보지 못한 상황. 2002년에 광화문에서 이미 느꼈어야 했던 건데.
가끔은 내가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둘째가 태어난 뒤 처음으로 네 식구가 신발을 사러 근처 마리오 아울렛에 갔다. 주차장에서 10분도 넘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다른 움직일 때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유모차에서 자는 아이를 데리고는 물건을 구경할 수도 없다. 나이키 매장 정도는 돼야 쾌적하다. 결국, 마지막에는 아내가 아기 띠로 아이를 안고, 나는 에스컬레이터로 유모차를 옮겼다.
또 하나,
아는 분이 너무너무 좋은 펜션을 알아냈다며 한참을 칭찬하셔서 봄에는 가봐야지 하면서 아내에게 링크를 보냈더니 1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다. 11세 이하 어린이는 받지 않는다고. 제주에서도 많이 당했던 일이다. 열심히 찾아가면 입구에 조그맣게 쓰여 있는 노키즈존.
가끔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끔…보다는 자주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여전히 말은 고치기 힘들다.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후, 운명처럼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프로젝트는 우리가 한때 쓰기도 했고, 여전히 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쓰지 않는 말들에 대한 글을 쓰고 함께 읽는 프로젝트입니다.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프로젝트는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캠페인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29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던 건 장류진 작가의 글이었다.
난 차별의 가해자가 아니야! - 장류진
- “나는 이런 말을 안 쓰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야”를 내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었지만 더는 아니에요”를 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직 멀었지만
이 책의 수 많은 좋은 구절을 다 까먹어 놓구선, 그래도 일상에서 특권과 차별을 발견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건 다행이다.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너머 무언가를 해야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작가의 말에 공감한다. 무엇을 해야할 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꾸준히 차별을 드러내는 소극적인 조치 정도로 시작해봐야겠다.
한겨례의 특권의 발견이라는 기사에 나온 이야기.
사회는 ‘특권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불편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끊임없이 끌고 올 수밖에 없다.